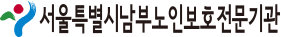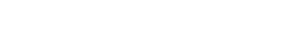SITEMAP
알림마당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보도자료
2023-01.01~7.31 가톨릭평화신문칼럼연재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7-12
- 조회수
- 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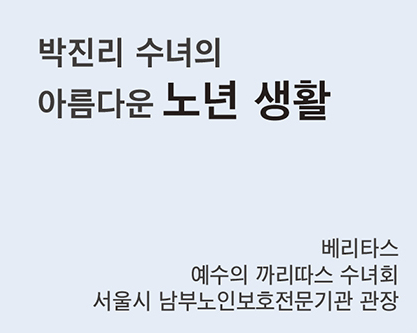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어르신 중에 나타나는 양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성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얇은 이불을 보자기 삼아 침실에 있는 화장지, 베게, 옷가지들을 싸서 머리에 이고 “아이들과 영감에게 밥을 해주러 가야 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걱정”이라며 출입문을 찾아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 오늘은 밤도 늦었으니 푹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도 식사 잘했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으니 안심하셔도 돼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안심하고 보따리를 내려놓은 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한 번은 간식으로 딸기를 드렸더니 드시지 않고 장 속에 넣어 두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쭙는 말에 “자식이 오면 주려고 한다”는 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련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겼던 마음은 치매가 걸린 뒤에도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아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 수녀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대신하여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노랗게 상기된 얼굴로 호흡을 거칠게 쉬고 계셨던 어머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서는데,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자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녀님…. 밥... 드시고... 가.세.요.”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아닌 상대를 중심에 두고 살피는 마음은 자식에게 수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며 살아왔던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중에도 밥걱정을 해 주시던 동창 수녀님의 어머니는 이틀 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밥’은 음식 너머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밥 먹었니?”, “식사는 하셨어요?”라는 인사는 전쟁과 기근을 겪은 이후 이웃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는지 서로 걱정해 주며 안부를 묻는 인사말에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밥’으로 표현되는 인사가 많습니다. 안부를 물을 때는 “밥은 먹고 다니니?”하고 묻고, 잘 챙겨 먹고 다닌다는 답변이 오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자 할 때는 “제가 밥을 살게요”라며 감사의 표현을 하고, 혼날 짓을 하면 “밥 먹을 생각 하지 마라!”하며 밥값의 무게를 깨우치게도 합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쁘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사는 거야”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서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밥심’으로 살기 위해 의지적으로 챙겨 먹고 나면 한결 빠르게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 안에는 반가움, 걱정, 기쁨 등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식사를 하셨어요?’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치아가 약해지고 입맛이 없어져 식사를 대충 때우면서도 자식들이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는 늘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몇십 년을 걱정하시며 살아오신 부모님께 밥이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식사는 하셨어요?”하며 건강을 챙겨드리는 안부 인사를 건네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리타스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진리 수녀의
아름다운 노년 생활